D-8+2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나와 가장 맞지 않았던 일이 뭐였는지 물으면 두 말 필요 없이 민원업무를 꼽는다.
20살 때부터 공무원이 되기 직전까지 식당, 카페, 마트, 서점, 편의점, 빵집 등 열 가지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손님 때문에 울어본 기억은 없다. 하지만 공무원이 된 후 민원인들은 주기적으로 나를 울렸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는 손님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욕을 먹지 않았는데,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돈을 주면서도 욕을 배부르게 먹었다. 우리끼리는 욕을 먹는 것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며 위로하지만, 욕을 듣는 그 순간에는 분노와 수치심을 참는 것이 정말이지 쉽지 않다.
나는 화난 민원인의 공격에 매번 너무 쉽게 짓밟혔다. 그럴 때마다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참 곱게 자랐구나 싶었다. 미리 좀 더 힘들게 살아볼 걸 그랬나.
나와는 달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신기한 직원들이 있다. 그들은 상대가 뭐라고 하든 친절함을 잃지 않는다. 마치 미친 전투력을 가진 정예부대가 그들의 감정을 철통 방어하고 있는 것 같다. 어째서 그게 가능한 걸까.
나름대로 추측해본 결과, 아무래도 그 정예부대의 정체는 자존감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누가 내가 죽으라고 굿을 하든, 망하라고 염불을 하든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 자존감이 '오늘부터 난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될 거야' 한다고 높아지는 거라면 이 세상에서 슬픔, 눈물 이런 단어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제 10일 후면 '민원'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심사위원', '독자', '시청자' 같은 두려운 단어들이 차지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넌 좀 더 힘들어봐야 한다는 듯이 그나마 있던 자존감까지 송두리째 빼앗길지도 모른다. 그럼 어쩔 수 있나. 울면서 그 슬픔에 대해, 내가 흘린 눈물에 대해 또 한 편의 글을 써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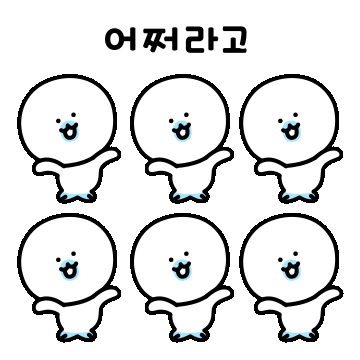
'퇴사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무원 퇴사일기]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남들이 보는 모습 사이의 간극 (0) | 2021.06.25 |
|---|---|
| [공무원 퇴사일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0) | 2021.06.23 |
| [공무원 퇴사일기] 마지막이 처음처럼 서툴더라도 (0) | 2021.06.21 |
| [공무원 퇴사일기] 20살로 돌아간다고 해도 (0) | 2021.06.20 |
| [공무원 퇴사일기] 꿈이 있으면 반쯤은 성공입니다 (0) | 2021.06.19 |